2нҡҢ мһ„лһҖ진нҳјкіЎ(еЈ¬дәӮйҺӯйӯӮжӣІ) м—¬лӘ…(й»ҺжҳҺ)мқҳ лӢӨлҢҖнҸ¬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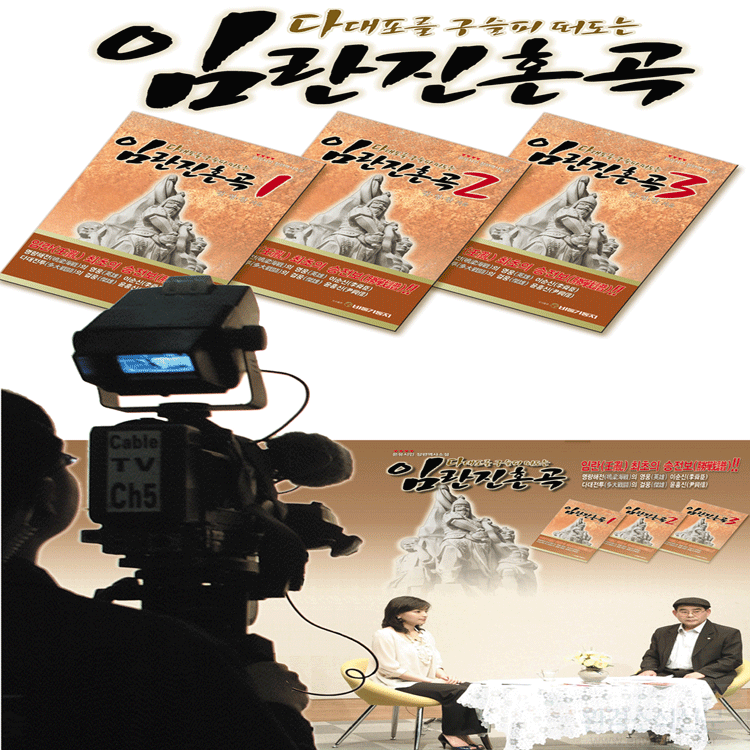
2нҡҢ мһ„лһҖ진нҳјкіЎ(еЈ¬дәӮйҺӯйӯӮжӣІ) м—¬лӘ…(й»ҺжҳҺ)мқҳ лӢӨлҢҖнҸ¬
“л°”лӢӨк°Җ мӮјмјңлІ„лҰ° к·ё лҸ„мҡ”мғҲл¬ҙлҰ¬мҷҖ л¬јм—җ л– мҳӨлҘё к·ё мҲұн•ң мӮ¬мІҙл“Ө…, лҸ„лҢҖмІҙ лӯҳ мқҳлҜён•ҳлҠ” кІғмқјк№Ң?”
мҷңкөӯмқҙ м „мҹҒмқ„ лҸ„л°ңн•ҳлҰ¬лқјлҠ” кІғмқ„ м§ҖлӮҳм№ҳкІҢ мҡ°л Өн•ң нғ“м—җ к·ёлҹ° н•ҙкҙҙн•ң кҝҲмқ„ кҫём—ҲмңјлҰ¬лқјлҠ” мғқк°Ғмқҙ л“Өм—Ҳкі , лҳҗ н•ңнҺёмңјлЎңлҠ” м–ҙлҠҗлҚ§ лӮҳмқҙ л“Өм–ҙ мҶҢмӢ¬н•ҙ진 нғ“мқҙл ӨлӢҲ н•ҳлҠ” мғқк°Ғм—җ мҠӨмҠӨлЎңлҘј м§Ҳмұ…н•ҳкё°лҸ„ н–ҲлӢӨ.
лӮҳлҠ” лӮҙ мғқм• лҘј нҶөн•ҙ лӮҳмқҳ м„ңмҠ¬ нҚјлҹ° м№јлӮ лЎңлҸ„ мҲұн•ң мЈҪмқҢмқ„ мғқмӮ°н•ҙмҷ”лӢӨ. м „мһҘ(жҲ°е ҙ)м—җм„ңлҠ” мҲұн•ң м Ғмқҳ лӘ©мқ„ лІ м—Ҳкі , л¶Җмһ„м§Җм—җм„ңлҠ” мҲұн•ң л°ұм„ұмқҳ лӘ©мқ„ лІ м—ҲлӢӨ. к·ёл•Ңл§ҲлӢӨ лҠҗкјҲлҚҳ мЈҪмқҢмқҖ кіөн—Ҳ(з©әиҷӣ)н•ҳкі л¬ҙмқҳлҜё(з„Ўж„Ҹе‘і)н–ҲлӢӨ.
лӮҳлҠ” м—¬нғңк»Ҹ мӮҙм•„мҳӨл©ҙм„ң мЈҪмқҢ л”°мң„лҘј л‘җл өкІҢ м—¬кёҙ м Ғмқҙ м—Ҷм—ҲлӢӨ. л”°лқјм„ң мЈҪмқҢмқ„ 진м§Җн•ҳкІҢ мғқк°Ғн•ҙліё л°”лҸ„ м—Ҷм—ҲлӢӨ. л¬ҙмҳҲлҘј мқөнһҢ мһҘмҲҳлқјл©ҙ мқҳлӢ№ мЈҪмқҢмқ„ л‘җл ӨмӣҢн•ҙм„ңлҠ” м•Ҳ лҗңлӢӨ. лӘ…мғүмқҙ мһҘмҲҳлқјл©ҙ м Ғмқҙ мЎҙмһ¬н•ҳлҠ” н•ң лҠҳ мЈҪмқҢмқ„ м—јл‘җм—җ л‘җм–ҙм•јн•ңлӢӨ. к·ёлҰ¬кі мЈҪмқҢмқ„ мқҖл°ҖнһҲ мҰҗкёё мӨ„ м•Ңм•„м•јн•ңлӢӨ.
‘мЈҪмқҢ…, мЈҪмқҢ…. л°”лӢӨ…, л°”лӢӨ…. лҸ„мҡ”мғҲ…, лҸ„мҡ”мғҲл“Ө…. мӮ¬мІҙ…, мӮ¬мІҙл“Ө….’
л°©кёҲ м „м—җ кҫём—ҲлҚҳ м•…лӘҪмқҳ мҡ”мҶҢл“Өмқ„ лҗҳлҮҢлҠ” мҲңк°„ мЈҪмқҢмқҳ мӢӨмІҙк°Җ лҚ”мҡұ нҷ•м—°н•ҳкІҢ к°җм§Җлҗҳм—ҲлӢӨ. к·ёлҰ¬кі л‘җл ӨмӣҖмқҙлһҖ к°Җкіө(жһ¶з©ә)мқҳ м Ғл“Өмқҙ кІҖмқҖ мҙүмҲҳ(и§ёжүӢ)лҘј л“ӨмқҙлҢҖл©° л–јлҘј м§Җм–ҙ лӘ°л Өл“ңлҠ” м°©к°Ғм—җ л№ мЎҢлӢӨ.
лӮҳлҠ” м§ҖкёҲк№Ңм§Җ мӮҙм•„мҳӨл©ҙм„ң мӮ¬нӣ„м„ёкі„к°Җ мЎҙмһ¬н•ҳлҰ¬лқјкі лҜҝм§Җ м•Ҡм•ҳлӢӨ. лӮҙк°Җ лӮЁмқҳ лӘёмқ„ л№Ңл Ө мһ мӢң м„ёмғҒм—җ лӮҳмҷ”л“Ҝмқҙ, лӮҙк°Җ мЈҪмңјл©ҙ к·ё лҲ„кө°к°Җк°Җ лҳҗн•ң лӮҳмқҳ лӘёмқ„ л№Ңл Ө м„ёмғҒм—җ лӮҳмҳ¬ кІғмқҙлқј лҜҝм—ҲлӢӨ. к·ёлҹ°лҚ° л°©кёҲ м „м—җ кҫј к·ё м°ёнҳ№н•ң кҝҲмқҖ мЈҪмқҢм—җ лҢҖн•ң лӮҳмқҳ кё°мЎҙмқёмӢқмқ„ лҝҢлҰ¬м§ё нқ”л“Өм–ҙлҶ“м•ҳлӢӨ.
к·ё кҝҲмқ„ нҶөн•ҙ мЈҪмқҢмқҙ лӢЁм§Җ мғқкіј мӮ¬мқҳ л„ҳлӮҳл“Ұмқҙ м•„лӢҲлһҖ кІғмқ„, мЈҪмқҢмқ„ лӢӨмҠӨлҰ¬лҠ” к·ё л¬ҙм–ёк°Җмқҳ мӢӨмІҙк°Җ л°”лЎң кіҒм—җ, м–ҙм©Ңл©ҙ лӮҙ м•Ҳм—җ мһҗлҰ¬н•ҳкі мһҲмқҢмқ„ лҳҗл ·н•ҳкІҢ мқём§Җ(иӘҚзҹҘ)н• мҲҳ мһҲм—ҲлӢӨ. лҝҗл§Ң м•„лӢҲлқј ліҙмқҙм§Җ м•ҠлҠ” мӮҙмқҳк°Җ, л“ӨлҰ¬м§Җ м•ҠлҠ” м Ғмқҳк°Җ м–ҙл‘җмҡҙ кіөк°„мқ„, к·ёлҰ¬кі лӮҙ м•Ҳмқ„ к·ёл“қ л©”мҡ°кі мһҲмқҢмқ„ 분лӘ…нһҲ лҠҗкјҲлӢӨ.
л¬јмң„м—җ л– мһҲлҠ” мҲұн•ң мЈјкІҖл“Ө, к·ё мӮ¬мІҙл“Өмқҳ л©ҙл©ҙмқҖ лӮҙк°Җ м•Ңкі м§ҖлӮҙмҳЁ мӮ¬лһҢл“Өмқҙмҡ”, кұ” мӨ‘м—җлҠ” лӮҙк°Җ мӮ¬лһ‘н•ҳлҠ” мӮ¬лһҢл“Өмқҳ л©ҙл©ҙмқҙлӢӨ. к·ё кҝҲмқҙ м–ҙм°ҢлӮҳ мғқмғқн•ҳлҚҳм§Җ л¬ёл“қ мқҳкө¬мӢ¬мқҙ мқјм–ҙ мһ л“Өм–ҙ мһҲмқ„ мӢқмҶ”(йЈҹзҺҮ)л“Өмқ„ мқјмқјмқҙ к№ЁмӣҢ мӮҙм•„мһҲмқҢмқ„ лӮҙ лҲҲмңјлЎң м§Ғм ‘ нҷ•мқён•ҳкі мӢ¶м—ҲлӢӨ. к·ёлҹ¬лӮҳ мӮҙм•„мһҲмқҖл“Ө, к·ё мӮҙм•„мһҲмқҢмқ„ нҷ•мқён•ҳлҠ” мҲңк°„мқҙ мҳӨнһҲл Ө л¶Җм§Ҳм—ҶлҠ” кҝҲмқҙлқј н• мҲҳлҸ„ мһҲмқ„ кІғмқҙлӢӨ.
кі§ мЈҪмқҢмқҳ мӮ¬мӢ (жӯ»зҘһ)мқҙ 피비лҰ°лӮҙлҘј 물씬 н’Қкё°л©° лӢӨлҢҖл§Ңмқҳ н•ҙн’Қм—җ мӢӨл Ө мҳӨлҰ¬лқјлҠ” кІғмқ„ нҷ•мӢ н–ҲлӢӨ. к·ё кҝҲмқҖ лЁёмһ–м•„ лӢӨк°Җмҳ¬ мЈҪмқҢмқ„ нҳ„мӢң(йЎҜзӨә)н•ҳлҠ” кҝҲмқҙмҡ”, к·ёкІғлҸ„ лӮҙк°Җ мӮ¬лһ‘н•ҳлҠ” мқҙл“Өкіј лҚ”л¶Ҳм–ҙ л§һкІҢ лҗ л–јмЈҪмқҢмқ„ мҳҲмӢң(иұ«зӨә)н•ҳлҠ” кҝҲмқҙлҰ¬лқј.
мҳЁк°– л¶Ҳкёён•ң мғқк°Ғмқҙ кј¬лҰ¬м—җ кј¬лҰ¬лҘј л¬јкі л– мҳ¬лһҗлӢӨ. к№Ём–ҙмһҲм–ҙлҸ„ м—¬м „нһҲ м•…лӘҪмқ„ кҫёлҠ”л“Ҝн–ҲлӢӨ. к·ёл ҮкІҢ мЈҪмқҢм—җ лҢҖн•ң л§үм—°н•ң л‘җл ӨмӣҖкіј к·ёлЎңмқён•ң мӢ¬м Ғ мӨ‘м••к°җ мҶҚм—җ н•ңм°ёмқ„ л’ӨмІҷмқҙлӢӨк°Җ мһҗлҰ¬лҘј н„ёкі мқјм–ҙлӮ¬лӢӨ. к·ёлҰ¬кі н•ңлҸҷм•Ҳ мғқк°Ғмқҳ к°ҖлӢҘмқ„ мһЎмқ„ мҲҳ м—Ҷм–ҙ л§қм—°нһҲ л°©л¬ё л°–мқҳ м§ҷмқҖ м–ҙл‘ мһҗлқҪл§Ңмқ„ мқ‘мӢңн•ҳкі мһҲм—ҲлӢӨ. л¬ёл“қ лЁјлҚ°м„ң нҷ°м№ҳлҠ” лӢӯмҡёмқҢмҶҢлҰ¬к°Җ л“Өл Өмҷ”лӢӨ. кі§ м—¬лӘ…мқҙ м—¬лҠҗ лӮ мІҳлҹј м–ҙк№Җм—Ҷмқҙ л°қм•„мҳ¬ кІғмқҙлӢӨ.
“кҝҲмқ„ нҶөн•ҙ нҳ„мӢңн•ҳлҠ” л°”к°Җ лҸ„л¬ҙм§Җ лӯ”м§Җ….”
лӮҙ мһ…м—җм„ң нқҳлҹ¬лӮҳмҳЁ мӨ‘м–јкұ°лҰјмқҙ л§Ҳм№ҳ кіҒм—җм„ң лҲ„кө°к°Җк°Җ мӨ‘м–јкұ°лҰ¬лҠ” мҶҢлҰ¬мІҳлҹј лӮҙ к·Җм—җ лӮҜм„ӨкІҢ кіөлӘ…(е…ұйіҙ)лҗҳм—ҲлӢӨ.
л¬ҙлҰҮ к·ё мІҳм°ён•ң мЈјкІҖмқҳ мһ”н•ҙл“ӨмқҖ л¬ҙм—Үмқ„ мқҳлҜён•ҳлҠ” кІғмқёк°Җ. мҷңкө¬(еҖӯеҜҮ)мқҳ м№ЁлһөмЎ°м§җмқ„ к°„нҢҢ(зңӢз ҙ)н•ҳкі лҸ„ л§ҲлғҘ мҶҚмҲҳл¬ҙмұ…мқј мҲҳл°–м—җ м—ҶлҠ” к·№мӢ¬н•ң мһҗкҙҙк°җ(иҮӘ愧ж„ҹ)мқҳ л°ҳмҳҒмқёк°Җ, м•„лӢҲл©ҙ л¶Ҳк°Җн•ӯл Ҙм Ғ мғҒнҷ©м—җм„ң мҳӨлҠ” л…ёмӢ¬мҙҲмӮ¬(еӢһеҝғз„ҰжҖқ)мқҳ л°ҳмҳҒмқёк°Җ.
лӘЁл“ мӮ¬мІҙл“Өмқҙ мҳҲмҷё м—Ҷмқҙ мҪ”к°Җ лңҜкІЁм ёлӮҳк°„ кІғлҸ„ мҷңкө¬л“Өмқҙ м „кіјл¬ј(жҲ°жһңзү©)лЎң нқ”нһҲ мҪ”лҘј лІ м–ҙк°„лӢӨлҠ” мҶҢл¬ёмқ„ мқҖм—°мӨ‘ л“Өм–ҙмҳЁ н„°лқј, к·ёлЎңмқён•ҙ мһ мһ¬м ҒмңјлЎң нҳ•м„ұлҗң мҷёнҸ¬мӢ¬(з•ҸжҖ–еҝғ)мқҙ кҝҲмқ„ нҶөн•ҙ л“ңлҹ¬лӮё к°•л°•кҙҖл…җм Ғ(ејәиҝ«и§Җеҝөзҡ„) мӢӨнҳ„(еҜҰзҸҫ)мқёк°Җ.
кҝҲмқҙлһҖ мӮјлқјл§ҢмғҒмқ„ мЈјмһ¬н•ҳлҠ” мӢ л №(зҘһпҰі)мқҙлӮҳ мЎ°мғҒмқҳ нҳјл №(йӯӮпҰі)мқҙ лҜёлһҳм—җ лӢҘміҗмҳ¬ н•„м—°м Ғ(еҝ…然зҡ„)мӮ¬кұҙм—җ лҢҖмІҳн•ҳлҸ„лЎқ мҳҲмӢң(иұ«зӨә)н•ҳлҠ” кІғмқҙлқј м•Ңл Өм ё мҷ”лӢӨ. к·ёлҰ¬кі к·ёлҹ° мҳҲм–ём Ғ нҳ„лӘҪ(йЎҜеӨў)мқҳ кІҪмҡ°, кұ°мқҳ л№—лӮҳк°Җм§Җ м•Ҡм•ҳмқҢмқҙ мҲұн•ң мӮ¬лЎҖмҷҖ кі мҰқ(иҖғиӯү)мқ„ нҶөн•ҙ мқөнһҲ м•Ңл Ө진 л°”лӢӨ.
к·ё кҝҲмқҖ лӢӨк°Җмҳ¬ лҜёлһҳмқҳ мқјл“Өмқ„ лҜёлҰ¬ ліҙм—¬мӨҢмңјлЎңм„ң л§Ҳл•…нһҲ л°ӣм•„л“Өм—¬м•јн• н•„м—°м Ғ мӮ¬н•„к·Җм •(дәӢеҝ…жӯёжӯЈ)мһ„мқ„ м•”мӢңн•ҳлҠ” кҝҲмқҙлҰ¬лқј.
“м°ёмңјлЎң л‘җл өлҸ„лӢӨ. мҷңм№Ёмқҙ м§Җл Ҳм§җмһ‘мқҙ м•„лӢҢ, мқҙм ң кі§ нҳ„мӢӨлЎң лӢӨк°Җмҳ¬ мһ¬лӮңмһ„м—җлһҙ. к·ёл ҮлӢӨл©ҙ мқҙлҘј м–ҙм°Ңн•ҙм•јн•ңлӢЁ л§җмқёк°Җ?”
л§үм—°н•ң л‘җл ӨмӣҖмқҖ м–ҙм°Ңн•ҙліј мҲҳ м—ҶлҠ” л¶Ҳк°Җн•ӯл Ҙм Ғ кі нҶөмқҙлӢӨ. к·ёл Үкё°м—җ лӮҳлҠ” н•ң лӮұ мһ‘мқҖ кё°лҢҖм—җ м—јмӣҗ(еҝөйЎҳ)мқ„ кұёкі нҒ° нқ¬л§қмІҳлҹј мқҳм§Җн• мҲҳл°–м—җ м—ҶлҠ” кІғмқҙлӢӨ.
‘м ңл°ң, кіөм—°н•ң кё°мҡ°(жқһжҶӮ)лЎң лҒқлӮ¬мңјл©ҙ….’
мҶҢлҰ„мқҙ лҒјм№ҳлҰ¬л§ҢнҒј м§ҷмқҖ м–ҙл‘ мқҙ мҳӨнһҲл Ө нқ¬л””нқ° нҷ”м„ м§ҖлЎң м—¬кІЁм ё л¬ёл“қ мӢң н•ң мҲҳлҘј л– мҳ¬л ёлӢӨ.
е’·йіҘдёҚйЈӣиҗҪ(лҸ„мЎ°л¶Ҳ비лқҪ) лҸ„мҡ”мғҲ 비мғҒ лӘ»н•ҳм—¬ 추лқҪн•ҳкі ,
е»Јжө·еӨҡ溺еұҚ(кҙ‘н•ҙлӢӨмқөмӢң) л„ҲлҘё л°”лӢӨм—җ л„җлҰ° кІғмқҙ мӢңмІҙлҚ”лқј
еҫҢеӨңеӨўиә«жјҸ(нӣ„м•јлӘҪмӢ лЈЁ) м§ҖлӮңл°Ө нқүлӘҪмңјлЎң мҳЁлӘёмқҙ л•Җм—җ м –м—ҲмңјлӮҳ,
жӯӨдёӯиҝ‘з·ЈжҶӮ(м°ЁмӨ‘к·јм—°мҡ°) к·ё кІҪнҷ© мӨ‘м—җлҸ„ к°Җк№Ңмҡҙ мқём—°мқҙ кұұм •лҗҳлҠ”кө¬лӮҳ.
е·ІеҫҖд№ӢдёҚи««(мқҙмҷ•м§Җл¶Ҳк°„) м§ҖлӮҳк°„ мқјмқҖ м–ҙм©” мҲҳ м—Ҷм–ҙлҸ„,
дҫҶиҖ…д№ӢеҸҜйҒ“(лһҳмһҗм§Җк°ҖлҸ„) лӢӨк°Җмҳ¬ мқјмқҖ л°”лЎңмһЎм•„м•ј н• кІғмқҙлӢҲ.
еӨ©ж–Ү究зҘһзӯ–(мІңл¬ёкө¬мӢ мұ…) н•ҳлҠҳмқҳ мқҙм№ҳм—җ лӢҝмқ„ мӢ кё°н•ң мұ…лһөмқ„ кө¬н•ҳкі ,
ең°зҗҶзӘ®еҰҷз®—(м§ҖлҰ¬к¶Ғл¬ҳмӮ°) л•…мқҳ мқҙм№ҳм—җ лӢҝмқ„ мҳӨл¬ҳн•ң кі„нҡҚмқ„ лӮҙлҶ“мңјлҰ¬лқј.
вҖ»дё»: ‘е·ІеҫҖд№ӢдёҚи«« дҫҶиҖ…д№ӢеҸҜйҒ“’лҠ” мӨ‘көӯ мҶЎ(е®Ӣ)лӮҳлқј мӢңмқё лҸ„м—°лӘ…(йҷ¶ж·өжҳҺ)мқҳ мһЎмӢң(йӣңи©©)м—җм„ң мқёмҡ©
3 нҡҢ
л¬ёл“қ м§ҡмқҙлҠ” кІғмқҙ мһҲм–ҙ м„ңнғҒ(жӣёеҚ“)м—җ лӢӨк°Җк°Җ нҳёлЎұмқ„ л°қнҳ”лӢӨ. к·ёлҰ¬кі м „лӮ мҳӨнӣ„ лҠҰкІҢ нҢҢл°ң(ж“әж’Ҙ)мқ„ нҶөн•ҙ м „лӢ¬лҗҳм–ҙмҳЁ лҸҷлһҳл¶ҖмӮ¬(жқұиҗҠеәңдҪҝ) мҶЎмғҒнҳ„(е®ӢиұЎиіў)мқҳ м„ңм°°(жӣёжңӯ)мқ„ лӢӨмӢң н•ң лІҲ кјјкјјнһҲ мӮҙнҺҙліҙм•ҳлӢӨ.
кёүл°•н•ң мӢ¬м •м—җ мҙҲлҘј лӢӨнүҲ нқҳл Ө м“ҙ м„ңм°°лЎң к°“ м •нғҗ(еҒөжҺў)н•ҳкі лҸҢм•„мҳЁ л°Җм •(еҜҶеҒө)мқҳ ліҙкі лӮҙмҡ©мқҙлһҖ м „м ңн•ҳм—җ м“°мӢңл§Ҳ섬мқҳ мҷңкө°лҸҷнғңк°Җ мғҒм„ёнһҲ кё°мҲ лҗҳм–ҙ мһҲм—ҲлӢӨ.
‘лӢӨлҢҖнҸ¬м§„мІЁмӮ¬ мңӨнқҘмӢ кіөк»ҳ кёүн•ң м „м–ё(еӮіиЁҖ)мқҙ мһҲмӮ¬мҳөлӢҲлӢӨ. к°Ғм„Өн•ҳкі ….’
мҶЎмғҒнҳ„мқҖ мҷңкөӯмқҳ нҳ„мһ¬ мғҒнҷ©мңјлЎң ліҙм•„ м „мҹҒмқ„ н”јн•ҳкё°лһҖ л¶Ҳк°ҖлҠҘн•ң кІғмқҙкі , мҷңкөӯмқҳ м „мҹҒмӨҖ비 лҳҗн•ң л§үл°”м§Җм—җ мқҙлҘҙл ҖмқҢмқ„ м „н–ҲлӢӨ.
‘мҷңкөӯмқҳ кҙҖл°ұ(й—ңдјҜ) лҸ„мҡ”нҶ лҜё нһҲлҚ°мҡ”мӢң[иұҠиҮЈз§Җеҗү]лҠ” лӢӨмқҙл¬ҳ[еӨ§еҗҚ]л“Өмқ„ м ңм••н•ҳкі 100л…„м—җ кұём№ң мҷңкөӯмқҳ 분м—ҙкіј нҳјлһҖмқ„ мҲҳмҠөн•ҳм—¬ н•ҳлӮҳмқҳ нҶөмқјкөӯк°ҖлЎң нҸүм •(е№іе®ҡ)н•ҳлҠ”лҚ° м„ұкіөн•ҳмҳҖмңјлӮҳ, к·ё кіјм •мқ„ нҶөн•ҙ кі мЎ°лҗң м ңнӣ„(и«ёдҫҜ)л“Өмқҳ л¶Ҳл§Ңкіј мҡ•кө¬лҘј н•ҙмҶҢмӢңмјңмӨ„ л°©лҸ„к°Җ м—Ҷмһҗ кІ°көӯ н•ҙмҷёлЎң н‘ңм¶ңмӢңнӮӨл ӨлҠ” мқҳлҸ„м—җм„ң лӘ…кіј мЎ°м„ мқ„ мғҒлҢҖлЎң м „мҹҒмқ„ лҸ„лӘЁн•ҳкё°м—җ мқҙлҘҙл ҖмӮ¬мҳөлӢҲлӢӨ.’
‘мқҙлҜё лӮҳкі м•ј[еҗҚеҸӨеұӢ] ліёмҳҒ(жң¬зҮҹ)мңјлЎңл¶Җн„° н•ҙнҳ‘(жө·еіҪ)мқ„ кұҙл„ҲмҷҖ м“°мӢңл§Ҳ섬 л¶ҒлӢЁ мҳӨмҡ°лқјн•ӯ[еӨ§жөҰжёҜ]мқјлҢҖм—җ нҸ¬м§„(йӢӘйҷі)н•ҳкі мһҲлҠ” мҷңкө° м„ л°ңлҢҖмқҳ мҲҳнҡЁк°Җ 5л§Ңмқҙ л„ҳлҠ”лӢӨн•ҳмҳӨл©°, ліёнҶ м—җ лҢҖкё° мӨ‘мқё мҷңлі‘к№Ңм§Җ лӘЁл‘җ н•©м№ҳл©ҙ к·ё лі‘л ҘмҲҳк°Җ лҢҖлһө 20л§ҢмқҖ мЎұнһҲ лҗҳлҰ¬лқјн•ҳмҳөлӢҲлӢӨ. к·ёмІҳлҹј м—„мІӯлӮң мҲҳмқҳ лі‘л ҘлҸ„ лҶҖлһҚм§Җл§Ң к·ё мҷңлі‘л“Өмқҙ лӮҙм „мқ„ нҶөн•ҙ мҳӨлЎңм§Җ м „мҹҒл§Ңмқ„ мқјмӮјм•„мҷ”лҚҳ мЎұмҶҚл“ӨлЎң н•ҳлӮҳк°ҷмқҙ мӢӨм „кІҪн—ҳмқҙ н’Қл¶Җн•ҳлӢӨн•ҳлӢҲ, к·ё лҳҗн•ң л‘җл өлӢӨ м•„лӢҲн• мҲҳ м—ҶмӮ¬мҳөлӢҲлӢӨ.’
‘мҷңкөӯмқҖ мӮ¬л©ҙмқҙ лӘЁл‘җ л°”лӢӨлЎң л‘ҳлҹ¬мӢёмқё 섬лӮҳлқјмқё к№ҢлӢӯм—җ мқјм°Қл¶Җн„° н•ҙмғҒм—җ лҠҘн•ҳкі мЎ°м„ кё°мҲ лҸ„ л°ңлӢ¬н•ңм§Җлқј, к·ёл“Өмқҙ м§ҖлӢҢ м„ лӢЁ(иҲ№еңҳ)мқҳ к·ңлӘЁ лҳҗн•ң мғҒмғҒмқ„ мҙҲмӣ”н•ҳлҰ¬л§ҢнҒј лҢҖлӢЁн•ҳлӢӨн•ҳмҳөлӢҲлӢӨ. лҢҖнҳ•м „н•Ё(еӨ§еһӢжҲ°иүҰ) м•„лӢӨмјҖл¶Җл„Ө(е®үе®…иҲ№) мҲҳмӢӯ мІҷмқ„ 비лЎҜн•ҳм—¬ м„ёнӮӨл¶Җл„Ө(й—ңиҲ№), кі л°”м•јл¶Җл„Ө(е°Ҹж—©иҲ№) л“ұ мһҗк·ёл§Ҳм№ҳ мІңм—¬ мІҷм—җ мқҙлҘҙлҠ” мӨ‘мҶҢнҳ• м „нҲ¬н•Ё(жҲ°й¬ӘиүҰ)л“Өмқҙ мқҙлҜё мҳӨмҡ°лқјн•ӯлӮҙлҝҗл§Ң м•„лӢҲлқј мЈјліҖмқјлҢҖмқҳ л„ҲлҘёл°”лӢӨлҘј мғҲк№Ңл§ЈкІҢ л’ӨлҚ®кі мһҲлӢӨ н•ҳмҳөлӢҲлӢӨ.’
‘к·ёлҰ¬кі мҷңкөӯ лӮҙм—җм„ лӮҙлЎңлқјн•ҳлҠ” мһҘмҲҳл“Өмқҙ мҙқ лҸҷмӣҗлҗ кІғмңјлЎң ліҙмқҙмҳөлӢҲлӢӨ. лҸ„мҡ”нҶ лҜёмқҳ мөңмёЎк·јмқё кі лӢҲмӢң мң нӮӨлӮҳк°Җ[е°ҸиҘҝиЎҢй•·]лҘј 비лЎҜн•ҳм—¬ к°ҖнҶ кё°мҡ”л§ҲмӮ¬[еҠ и—Өж·ёжӯЈ], кө¬лЎңлӢӨ лӮҳк°Җл§ҲмӮ¬[й»‘з”°й•·ж”ҝ], мӢңл§ҲмҰҲ мҡ”мӢңнһҲлЎң[еі¶жҙҘзҫ©ејҳ], нӣ„мҝ мӢңл§Ҳ л§ҲмӮ¬л…ёлҰ¬[зҰҸеі¶жӯЈеүҮ], нһҲлқјл…ё лӮҳк°Җм•јмҠӨ[е№ійҮҺй•·жі°], к°ҖнҶ мҡ”мӢңм•„нӮӨлқј[еҠ и—ӨеҳүжҳҺ], мҷҖнӮӨмһҗм№ҙ м•јмҠӨн•ҳлЈЁ[и„ҮеқӮе®үжІ»], к°ҖнғҖкё°лҰ¬ к°Җмё лӘЁнҶ [зүҮжЎҗдё”е…ғ], к°ҖмҠӨм•ј лӢӨмјҖл…ёлҰ¬[зіҹеұӢжӯҰеүҮ] л“ұмқҙ к°Ғ 분кө°(еҲҶи»Қ)мқ„ мқҙлҒҢ м„ лҙүмһҘмңјлЎң лӮҙм •лҗң мһҗл“Өмқҙлқј н•ҳмҳөлӢҲлӢӨ.’
‘мқҙлҜё м—¬лҹ¬н•ҙ м „л¶Җн„° лҸ„мҡ”нҶ лҜёлҠ” м—¬лҹ¬ м •нҷ©мқ„ нҶөн•ҙ м „мҹҒлҸ„л°ңмқҳмӮ¬к°Җ мһҲмқҢмқ„ 분лӘ…нһҲ л°қнҳҖмҷ”лӮҳмқҙлӢӨ. м–‘көӯ(е…©еңӢ)мқ„ мҳӨк°ҖлҠ” мӮ¬мӢ (дҪҝиҮЈ)л“Өмқ„ нҶөн•ҙ “лӘ…(жҳҺ)мқ„ м№ҳкі мһҗн•ҳлӢҲ кёёмқ„ л№ҢлҰ¬мһҗ.[еҒҮйҒ“е…ҘжҳҺ]”лқјлҠ” н„°л¬ҙлӢҲм—ҶлҠ” мҡ”кө¬лҘј мЎ°м„ мЎ°м •м—җ м—¬лҹ¬ м°ЁлЎҖлӮҳ нҶөліҙн•ҙмҷ”мҶҢмқҙлӢӨ. мЎ°м •мқҖ к·ё мҡ”кө¬лҘј лҢҖмҲҳлЎӯм§Җ м•ҠкІҢ м—¬кІЁ л¬өмӮҙн•ҙмҳЁ н„°лқј, 분лӘ… к·ё көҗм„ӯ(дәӨж¶ү)мқҳ кІ°л ¬(жұәиЈӮ)мқ„ кө¬мӢӨлЎң лЁјм Җ мЎ°м„ мқ„ м№ҳкі мқҙм–ҙ лӘ…к№Ңм§Җ м№ҳкІ лӢӨлҠ” л§қмғҒмқ„ 진мһ‘ көінһҢ л“Ҝн•ҳмҳөлӢҲлӢӨ.’
мҶЎмғҒнҳ„мқҖ м„ңм°°мқҳ л§җлҜё(жң«е°ҫ)лҘј нҶөн•ҙ мһҗмӢ мқҙ лҠҗлҒјкі мһҲлҠ” л¶Ҳм•Ҳкіј мҡ°л Ө, л¶Ҳл§Ңмқ„ м—¬кіј(жҝҫйҒҺ)м—Ҷмқҙ 진мҶ”н•ҳкІҢ л“ңлҹ¬лғҲлӢӨ.
‘ліёкҙҖмқҖ к·јмһҗм—җлҸ„ мһ„кёҲк»ҳ мҷңкөӯкіјмқҳ м „мҹҒмқҖ кІ°мҪ” н”јн• мҲҳ м—ҶлҠ” мғҒнҷ©м—җ мқҙлҘҙл ҖмқҢмқ„ м•ҢлҰ¬кі к·ё лҢҖ비лҘј мҙүкө¬н•ҳлҠ” мғҒмҶҢ(дёҠз–Ҹ)лҘј м—¬лҹ¬ м°ЁлЎҖ мҳ¬л ёмңјлӮҳ, мқҙм ліёкҙҖмқҳ мғҒмҶҢлҘј м•„мҳҲ л¬өмӮҙн•ҳл Өл“ңлҠ” кІҪн–ҘмЎ°м°Ё ліҙмқҙлӢҲ н•ӯм°Ё мқҙлҘј м–ҙм°Ңн•ҙм•ј мўӢкІ мӮ¬мҳөлӢҲк№Ң. к·ёл Үл“Ҝ, мөңк·ј л“Өм–ҙ мҷңкөӯмқҖ мһ„м „м „м•ј(иҮЁжҲ°еүҚеӨң)лҘј л°©л¶ҲмјҖ н•ҳлҰ¬л§ҢнҒј м „мӢңмІҙм ң(жҲ°жҷӮй«”еҲ¶)лЎң 갖춰진лҚ°лӢӨ к·ёл“ӨлЎңл¶Җн„° мҙүл°ң(и§ёзҷј)мқҳ мӮҙкё°(ж®әж°Ј)л§Ҳм Җ лҠҗк»ҙм§ҖлӢҲ, мЎ°л§Ңк°„ л¶ҖмӮ°нҸ¬ л“ұмқ„ нҶөн•ҙ лҢҖкұ° м№Ёлһөн•ҙмҳ¬ кІғмқҙ л¶Ҳл¬ёк°Җм§Җ(дёҚе•ҸеҸҜзҹҘ)мқҙмҳөлӢҲлӢӨ.’
мҶЎмғҒнҳ„мқҖ мЎ°м • лҢҖмӢ л“Ө, лҚ” лӮҳм•„к°Җ м„ мЎ°мһ„кёҲк№Ңм§Җ мӢ лһ„н•ҳкІҢ 비лӮңн–ҲлӢӨ.
‘м„ мЎ°мһ„кёҲмқҙлһҖ мһҗк°Җ мӣҢлӮҷ мҶҢмӢ¬(е°Ҹеҝғ)н•ҳлӢӨ ліҙлӢҲ, мқҙм к·ё лҲ„кө¬мқҳ л§җлҸ„ к·ҖлҘј кё°мҡёмқҙл Өн•ҳм§Җ м•Ҡкі мһҳ лҜҝмңјл Өн•ҳм§Җ м•ҠмӮ¬мҳөлӢҲлӢӨ. кІҢлӢӨк°Җ мқҙлҹ° мғҒнҷ©м—җм„ңлҸ„ м—¬м „нһҲ мЈјлҸ„к¶ҢлӢӨнҲјкіј лӢ№лҰ¬лӢ№лһөм—җл§Ң мӮ¬нҷңмқ„ кІҪмЈјн• лҝҗ көӯм ңм •м„ёмқҳ нқҗлҰ„м—” н•ҳл“ұ кҙҖмӢ¬мЎ°м°Ё м—ҶлҠ” лҢҖмӢ л“Өмқҳ мһҘл§үм—җ к°Җл Ө, лӢ№мһҘмқҙлқјлҸ„ л“ӨмқҙлӢҘм№ м§Җ лӘЁлҘј мҷңкөӯмқҳ мң„нҳ‘мқ„ м „нҳҖ к№ЁлӢ«м§Җ лӘ»н•ҳкі мһҲлҠ” л“Ҝн•ҳмҳөлӢҲлӢӨ. м–ҙм©Ңл©ҙ мқҙлҹ° лӢӨкёүн•ң мғҒнҷ©мқјмҲҳлЎқ мһ„кёҲмқҙлӮҳ мЎ°м • лҢҖмӢ л“ӨмқҖ мһҗмІҙмқҳ нһҳмқ„ нӮӨмӣҢ лҢҖм Ғн•ҳл Өн•ҳкё°ліҙлӢӨ лӘ…м—җ лҚ”мҡұ мқҳмЎҙн•ҳл ӨлҠ” нғңлҸ„лҘј ліҙмқҙкі мһҲмӮ¬мҳөлӢҲлӢӨ. мЎ°м„ мқҙ л§Ҳм№ҳ лӘ…(жҳҺ)мқҳ мҶҚкөӯ(еұ¬еңӢ)мқём–‘ мҠӨмҠӨлЎң кІ©н•ҳ(ж јдёӢ)н•ҳкёё л§ҲлӢӨм•Ҡкі , лӘ…м—җ м ҲлҢҖм Ғ 충м„ұмқ„ 맹м•Ҫн•ЁмңјлЎңм„ң к·ёлЎңмқён•ң нҳёнҳң(дә’жғ )лҘј 맹мӢ (зӣІдҝЎ)н•ҳл Өл“ңлҠ” кІҪн–Ҙл§Ҳм Җ ліҙмқҙлҚ”мқҙлӢӨ. м„Өл§Ҳ лӘ…мқҳ мҡ°мӮ°(йӣЁеӮҳ)н•ҳм—җм„ңлҠ” мҷңкөӯмқёл“Ө н•Ёл¶ҖлЎң м№Ёлһөмқ„ кІҪкұ°(輕擧)н• лҰ¬ м—ҶлӢӨлҠ” л°©л§Ң(ж”ҫжј«)н•ң мӮ¬кі (жҖқиҖғ)лҘј көінһҢ нғ“мқҙлһҖ 추측лҸ„ л“ңмҳөлӢҲлӢӨ.’
к·ёлҰ¬кі мқҙнӣ„ л“ңлҹ¬лӮң мҷңкөӯмқҳ нҠ№мқҙн•ң лҸҷн–ҘмқҖ м—Ҷм—ҲлҠ”м§Җ, лӢӨлҢҖнҸ¬м§„м„ұ ліҙмҲҳмқҳ 진мІҷмғҒнҷ©мқҖ м–ҙл– н•ңм§ҖлҘј н•Ёк»ҳ л¬»кі мһҲм—ҲлӢӨ.
лӮҳлҠ” мҶЎмғҒнҳ„мқҳ м„ңм°° лӮҙмҡ©мқ„ кі°кі°мқҙ лҗҳмғҲкё°л©° м—¬лҹ¬ м •нҷ©мқ„ мЎ°лӘ©мЎ°лӘ© л”°м ёліҙм•ҳлӢӨ.
м„ мЎ°мһ„кёҲмқҙлӮҳ мЎ°м • лҢҖмӢ л“Ө лҢҖк°ңлҠ” л°ұл§Ң лҢҖкө°мқ„ м§Җл…”лӢӨлҠ” лӘ…м—җ лҢҖн•ҙм„ңлҠ” м§ҖлӮҳм№ҳкІҢ кіјлҢҖнҸүк°Җн•ҳм—¬мҳЁлҚ° л°ҳн•ҙ мҷңкөӯмқҖ л…ёлһөм§ҲмқҙлӮҳ мқјмӮјлҠ” н•ҙм Ғл¬ҙлҰ¬ м •лҸ„лЎң м§ҖлӮҳм№ҳкІҢ кіјмҶҢнҸүк°Җн•ҳм—¬мҷ”лӢӨ.
м„ мЎ°мһ„кёҲмқҖ м–јл§Ҳ м „ л§ҢмЎ°л°ұкҙҖ(ж»ҝжңқзҷҫе®ҳ)мқҙ лҸ„м—ҙн•ң мһҗлҰ¬м—җм„ң ‘мҷңкөӯмқҳ лҸ„мҡ”нҶ лҜёлһҖ мһҗк°Җ м ңм•„л¬ҙлҰ¬ нҒ° мҶҢлҰ¬ мһҳм№ҳкі л¬ҙм§ҖлӘҪл§Өн•ҳкё°лЎң к°җнһҲ мЎ°м„ мқҙлӮҳ лӘ…мқ„ мғҒлҢҖлЎң м „мҹҒмқ„ мқјмңјнӮ¬ л§Ңн•ң л°°нҸ¬лҸ„ м§ҖлӢҲм§Җ лӘ»н–Ҳмқ„ лҝҗлҚ”лҹ¬ к·ёлҹҙ лҠҘл ҘлҸ„ 갖추м§Ҳ лӘ»н–ҲлӢӨ. к·ёлҹ¬н•ҳлӢҲ мҷңкөӯмқҙ міҗл“Өм–ҙмҳ¬ кІғмқҙлқјл©° м§Җл Ҳ кұұм •н•ҳкұ°лӮҳ мӨҖ비н•ҳлҠ” мһҗм•јл§җлЎң м§җмқ„ лҠҘл©ён•ҳлҠ” мһҗмқҙл©°, мҠӨмҠӨлЎң м ң лӮҳлқјлҘј м—…мӢ м—¬кё°лҠ” мһҗмқҙлӢӨ.’лқј н•ҳмҳҖлӢӨ. мһ„кёҲмқҙ м§Ғм ‘ лӮҳм„ңм„ң мҷңм№Ём—җ лҢҖн•ҙ кұ°лЎ мЎ°м°Ё лӘ»н•ҳлҸ„лЎқ лӘ…н•ҳмҳҖкё°м—җ л“ңлҹ¬лӮҙлҶ“кі м „мҹҒмӨҖ비лқјлҸ„ н•ҳл©ҙ мһҗ칫 м–ҙлӘ…мқ„ кұ°мҠӨлҘҙлҠ” м—ӯм ҒмңјлЎң лӘ°лҰҙ мҲҳлҸ„ мһҲлҠ” нҳ•көӯмқҙм—ҲлӢӨ.
мҶЎмғҒнҳ„мқҖ лӮҳмҷҖ м •л°ңм—җкІҢ м „мҹҒмқ„ лҢҖ비н•ҳлӢӨліҙл©ҙ м—ӯм ҒмңјлЎң лӘ°лҰҙ к°ҖлҠҘм„ұлҸ„ м—Ҷмһ–м•„ мһҲмқҢмқ„ к·Җлқ”н–Ҳкі , к·ёл ҮлҚ”лқјлҸ„ мҷңкөӯмқҳ м№Ёлһөмқ„ мўҢмӢңн• мҲҳлҠ” м—Ҷмқ„ н„°мқҙлӢҲ лӮҳлҰ„лҢҖлЎң мІ м Җн•ң мӨҖ비лҘј н•ҳмһҗл©° кұ°л“ӯ лӢӨм§җн–ҲлӢӨ.
лӢӨлҢҖнҸ¬м§„мІЁмӮ¬лЎң л¶Җмһ„н•ң мқҙлһҳ м§ҖлӮң 2к°ңмӣ”м—¬ лҸҷм•Ҳ лӮҳлҰ„лҢҖлЎң мҷңкөӯмқҳ м№Ёлһөмқ„ лҢҖ비н•ҳм—¬ л§ҺмқҖ мӨҖ비лҘј н•ҳмҳҖлӢӨкі лҠ” н•ҳлӮҳ, к·ё лҜём§„н•Ём—җ мһҲм–ҙ л§ҢмЎұмҠӨлҹҪм§Җ лӘ»н•ң кІғмқҙ м–ҙл”” н•ңл‘җ к°Җм§ҖлҝҗмқҙкІ лҠ”к°Җ. м•„л¬ҙлҰ¬ кіЁлҳҳн•ҳкІҢ мғқк°Ғн•ҙлҙҗлҸ„ л§Ҳл•…н•ң лҢҖмұ…мқҙ м—Ҷкё°лЎ мҶЎмғҒнҳ„ліҙлӢӨ мҳӨнһҲл Ө лӮҙк°Җ лҚ”н• кІғмқҙлӢӨ.
4 нҡҢ
лӮҳлҠ” л‘җл ӨмӣҖкіј к·јмӢ¬мңјлЎң 짓лҲҢлҰ° лӢөлӢөн•ң 기분мқ„ л–ЁміҗлӮҙкё° мң„н•ҙ нҷҖлЎң кҙҖмӮ¬лҘј лІ—м–ҙлӮ¬лӢӨ. м•„м§Ғ м–ҙл‘ мқҙ мұ„ к°ҖмӢңм§Җ м•ҠмқҖ мӮ¬мң„лҠ” м§ҷмқҖ м•Ҳк°ңл§Ҳм Җ лҒјм–ҙ мӢңм•јк°Җ л¶Ҳ분лӘ…н•ҳкі , 바짓лӢЁм—җ м№ҳл Ғм№ҳл Ғ к°җкё°лҠ” л°ӨмқҙмҠ¬мқҙ м°Ёк°‘кІҢ лҠҗк»ҙмЎҢлӢӨ. л©ҖлҰ¬ л–Ём–ҙ진 кіім—җм„ң мӮ¬лһҢмқҳ кё°мІҷмқём§Җ м•„лӢҲл©ҙ лҸҷл¬јмқҳ кё°мІҷмқём§Җ м–јн•Ҹ л¶„к°„н• мҲҳлҠ” м—ҶмңјлӮҳ к°„к°„мқҙ л°”мҠӨлқҪкұ°лҰ¬лҠ” мҶҢлҰ¬к°Җ л“Өл Өмҷ”лӢӨ. 비лЎңмҶҢ лӮҳ мқҙмҷёмқҳ лӢӨлҘё кІғл“Өмқҙ лӮҙлҠ” кё°мІҷмңјлЎң мқён•ҙ к°„л°Өмқҳ м•…лӘҪмңјлЎңл¶Җн„° лІ—м–ҙлӮң л“Ҝ м—¬кІЁмЎҢлӢӨ.
лӢӨлҢҖнҸ¬м§„м„ұ лӮЁл¬ё м•һм—җ мһҗлҰ¬н•ң лӮҳлЈЁн„°мқҳ м ‘м•ҲлҢҖ(жҺҘеІёеһҲ)м—җ лҸ„м°©н–ҲлӢӨ. мқҙлҘё мӢңк°Ғмқҙлқј мӮ¬лһҢмқҳ лӘЁмҠөмқҖ м „нҳҖ лҲҲм—җ лқ„м§Җ м•Ҡкі , м–ҙл‘ мҶҚм—җ лӘҮлӘҮ лҸӣмқ„ мҳ¬лҰ¬м§Җ м•ҠмқҖ лӮҳлЈ»л°°л“Өкіј мҶҢнҳ• кұ°лЈ»л°°л“Өмқҙ мһ”мһ”н•ң мҲҳл©ҙмң„м—җ к°Җм§Җлҹ°нһҲ лҶ“м—¬мһҲлҠ” лӘЁмҠөмқҙ нқ¬лҒ„л¬ҙл Ҳн•ҳкІҢ мӢңм•јм—җ л“Өм–ҙмҷ”лӢӨ. к·ёмӨ‘м—җ ‘еҢ…еңҚ(нҸ¬мң„)’лқј м ҒнһҢ кұ°лЈ»л°°мқҳ 묶여мһҲлҠ” л°§мӨ„мқ„ н’Җкі л°°мң„лЎң лӣ°м–ҙмҳ¬лһҗлӢӨ. кұ°лЈ»л°°лҠ” мЈјм „л¶ҖлӮҳ лҚ•нҢҗ, мқҙл¬јм№ё, л©Қм—җлҝ” л“ұмқҙ лӘЁл‘җ мғҲлІҪмқҙмҠ¬мқ„ 듬лҝҚ лЁёкёҲкі мһҲм–ҙ л°ңмқ„ мҳ®кё°кё°м—җ кҪӨлӮҳ лҜёлҒ„лҹ¬мӣҢ м—¬к°„ мЎ°мӢ¬н•ҳм§Җ м•Ҡмңјл©ҙ м—үлҚ©л°©м•„лҘј м°§кІҢ лҗңлӢӨ.
лӘ°мҡҙлҸ„лҘј н–Ҙн•ҙ л…ёлҘј м Җм–ҙлӮҳк°”лӢӨ. л…ёк°Җ м„ нҳ„(иҲ№иҲ·)м—җ л¶Җл”ӘнһҲлҠ” мӮҗкұ°лҚ•кұ°лҰ¬лҠ” мҶҢлҰ¬мҷҖ л¬јмӮҙмқ„ к°ҖлҘҙлҠ” мІ лІ„лҚ•кұ°лҰ¬лҠ” мҶҢлҰ¬к°Җ мҠөкё° м°¬ м Ғл§үмқ„ кі мҰҲл„үмқҙ к№јлӢӨ. м–ҙл‘ кіј м§ҷмқҖ м•Ҳк°ң мҶҚм—җ кҝҲкІ°мІҳлҹј лӘҪлЎұн•ҳкІҢ мһ кІЁмһҲлҠ” лӘ°мҡҙлҸ„(жІ’йӣІеі¶) кё°мҠӯм—җ лӢҝм•ҳлӢӨ.
м–јн•Ҹ н•ҷмқҙ лӮ м•„к°ҖлҠ” нҳ•мғҒмқ„ н•ҳкі мһҲлҠ” лӘ°мҡҙлҸ„лҠ” н•ҙл°ң мҠӨл¬јм—¬м„Ҝ мһҘ(дёҲ)м—җ л¶Ҳкіјн•ң мһ‘мқҖ 섬мңјлЎң нҳ•м„ёк°Җ л‘ҘкёҖкі мҶҢлӢҙн–ҲлӢӨ. м–•мқҖ мӮ°м„ёмһ„м—җлҸ„ л¶Ҳкө¬н•ҳкі мҡёмҡём°Ҫм°Ҫн•ң н•ҙмҶЎкө°лқҪмқҙ лҚ”н• лӮҳмң„ м—Ҷмқҙ м—„мЎҙ(еҡҙе°Ҡ)н•ҳм—¬ нқҗнҠёлҹ¬м§Җл ӨлҠ” м¶©м •кіј мӢ л…җмқ„ мқјк№ЁмӣҢмЈјкіӨ н–Ҳкё°м—җ мһҗмЈј м°ҫм•ҳлӢӨ.
мӮ°м •(еұұй Ӯ)мңјлЎң мҳӨлҘҙлҠ” кёёмқҖ лҢҖмІҙлЎң мҷ„л§Ңн•ҳм—¬ н•ңкұёмқҢм—җ лӮҙлӢ¬м•„лҸ„ мҲЁмқҙ к°ҖмҒҳм§Җ м•Ҡм•ҳлӢӨ. 비лЎқ мһ‘мқҖ 섬мқјм§ҖлқјлҸ„ мӮ°кё°мҠӯмқҳ лҒқмқҖ мҳӨлһң м„ёмӣ” м№ЁмӢқм—җ мқҳн•ҙ к№Һм•„м§ҖлҘё лӢЁм• (ж–·еҙ–)мҷҖ мёөм•”м ҲлІҪ(еұӨе·–зө¶еЈҒ)мқ„ мқҙлЈЁкі , кіікіімқҳ кё°м•”кҙҙм„қ(еҘҮеІ©жҖӘзҹі)мқҖ м¶Өмқ„ 추л“Ҝ м¶ңл ҒмқҙлҠ” м°ҪнҢҢ(ж»„жіў)мҷҖ мһҳ м–ҙмҡёл ёлӢӨ.
лӘ°мҡҙлҸ„мқҳ м ҲкІҪмқҖ лӢӨлҢҖл§Ңмқҳ л“ңл„“мқҖ нҷ©кёҲл№ӣ лӘЁлһҳл°ӯкіј м–ҙмҡ°лҹ¬мЎҢмқ„ л•Ң лҚ”мҡұ л№јм–ҙлӮң н’Қкҙ‘мқ„ мһҗм•„лғҲлӢӨ. лҝҗл§Ң м•„лӢҲлқј м •мғҒм—җ м„ңм„ң м„ңл¶ҒмӘҪмңјлЎң л°”лқјліҙл©ҙ мһҘмһҗлҸ„(й•·еӯҗеі¶)к°Җ м•„л ЁнһҲ ліҙмқҙкі , лӮЁмӘҪмңјлЎңлҠ” лӮЁнҳ•м ңлҸ„, л¶Ғнҳ•м ңлҸ„, лӘ©лҸ„к°Җ ліҙмқҙл©°, мЈјмң„лЎңлҠ” лҸҷмқҙ섬, мҘҗ섬, лӘЁмһҗ섬, кі лҰ¬м„¬, мһҗ섬, лҸҷ섬, нҢ”ліҙ섬과 к·ё мҷём—җлҸ„ мқҙлҰ„ м—ҶлҠ” нҒ¬кі мһ‘мқҖ мҲұн•ң 섬л“Өмқҙ лӢӨнҲ¬м–ҙ мӢ 비кІҪ(зҘһз§ҳжҷҜ)мқ„ л“ңлҹ¬лғҲлӢӨ. к·ёлҹ° м ҲкІҪмқ„ нҳјмһҗ мҰҗкё°кё°м—” л„Ҳл¬ҙ м•„к№қлӢӨ м—¬кІЁ к°„нҳ№ к·Җн•ң мҶҗлӢҳмқ„ л§һмқ„лқјм№ҳл©ҙ м•һмһҘм„ңм„ң лӘ°мҡҙлҸ„ м •мғҒмңјлЎң м•ҲлӮҙн•ҳкіӨ н–ҲлӢӨ.
лӮ м”ЁлҠ” мҶҢмҠ¬н•ң л°”лһҢмқҙ л¶Ҳм–ҙлҸ„ мҷ„м—°нһҲ л¬ҙлҘҙмқөмқҖ лҙ„мқҙлӢӨ. мҳ…мқҖ м•Ҳк°ңк°Җ нҸ¬к·јн•ҳкІҢ к°җмӢј н•ҙмҶЎ мҲІмқҖ л¬јкё°лҘј н•ңк»Ҹ лЁёкёҲкі м§ҷмқҖ мҶ”н–Ҙмқ„ лӮҙлҝңм—ҲлӢӨ. 비лЎқ мһ‘мқҖ 섬м—җ л¶Ҳкіјн•ҳм§Җл§Ң мҲІмҶҚмқ„ н•ңм°ё лҚ”듬лӢӨ ліҙл©ҙ мҲІмқҙ к№Ҡкё°лЎң м–јн•Ҹ мӢ¬мӮ°мң кіЎ(ж·ұеұұе№Ҫи°·)м—җ л“Өм–ҙм„ л“Ҝн–ҲлӢӨ. лӘ°мҡҙлҸ„м—җлҠ” кҝ©лҸ„ л§Һм§Җл§Ң лӢӨлһҢмҘҗк°Җ мң лҸ… л§Һм•ҳлӢӨ. лӮҳлҠ” мһ‘кі м•ҷмҰқл§һмқҖлҚ°лӢӨ лӮ мҢ”кё°лЎң мһЎкё° нһҳл“ лӢӨлһҢмҘҗлҘј мўӢм•„н–ҲлӢӨ. к·ёлҰ¬кі кі мҰҲл„үн•ҳкі мҠөкё° м°¬ мҲІмҶҚмқ„ кұ°лӢҗ л•Ң л“Өл ӨмҳӨлҠ” лӢӨлһҢмҘҗмҡёмқҢмҶҢлҰ¬лҘј нҠ№нһҲ мўӢм•„н–ҲлӢӨ. лӢӨлһҢмҘҗмҡёмқҢмҶҢлҰ¬лҠ” м–јн•Ҹ л“Јкё°лЎ мғҲмҶҢлҰ¬мҷҖ 비мҠ·н•Ём—җлҸ„ лҸ…нҠ№н•ҳкё°лЎ лҸ„л¬ҙм§Җ л”°лқј нқүлӮҙ лӮҙкё°мЎ°м°Ё м–ҙл өлӢӨ м—¬кІјлӢӨ.
‘мҜ”мҜ”мҜ”мҜ”мҜҘ, мҜ”мҜ”мҜ”мҜ”мҜҘ….’
лӘ°мҡҙлҸ„ м •мғҒм—җ м„ңлӢҲ м—¬лӘ…мқҙ кё°лӢӨл ёлӢӨлҠ” л“Ҝ л•Ңл§Ҳм№Ё л¶үкІҢ 비춰мҷ”лӢӨ. м җм җмқҙ л°•нҳҖ м„ңм„ңнһҲ мңӨкіҪмқ„ л“ңлҹ¬лӮҙлҠ” нҒ¬кі мһ‘мқҖ 섬 л„ҲлЁё кҙ‘нҷңн•ң мҲҳнҸүм„ м—җ кұёлҰ° м“°мӢңл§Ҳ섬мқ„ м–ҙлҰјн•ҙлҙӨлӢӨ. м•„м§Ғ мҲҳнҸүм„ мқҖ м–ҙл‘ мқҳ мһ”мһ¬(ж®ҳеңЁ)лҘј л§Ҳм Җ л–Ём–ҙлӮҙм§Җ лӘ»н•ҳкі м–ҙл‘ мқҳ кі„мЎ°(йҡҺиӘҝ)м—җ көікІҢ к°ҮнҳҖмһҲм—ҲлӢӨ. н•ҳлҠҳмқҙ нҲ¬лӘ…н• л•җ л¶Ҳкіј мқјл°ұмқҙмӢӯ лҰ¬(йҮҢ)лӮЁм§“л°–м—җ л–Ём–ҙм§Җм§Җ м•ҠмқҖ м“°мӢңл§Ҳ섬мқҙ н•ңлҲҲм—җ мҸҳмҳҘ л“Өм–ҙмҳӨлҰ¬л§ҢнҒј л°”лЎң м§ҖмІҷм—җ лҶ“м—¬мһҲлҠ” кІғмқҙлӢӨ.
мқҙмңҪкі л»ҳкұҙ нғңм–‘мқҙ кІҖл¶үмқҖ н•Ҹл¬јмқ„ нҶ нҳҲ(еҗҗиЎҖ)н•ҳл©° мҶҹкө¬міҗ мҳӨлҘҙкі л…ёмқ„мқҳ нҢҢнҺёл“Өмқҙ л¬јкі кё° 비лҠҳмІҳлҹј мӮҙм•„ нҢ”л”ұкұ°л ёлӢӨ. л°”лһҢ н•ң м җ м—ҶлҠ” кІҖн‘ёлҘё л°”лӢӨлҠ” мһҗкёҖкұ°лҰ¬лҠ” нҢҢлһ‘(жіўжөӘ)мЎ°м°ЁлҸ„ л§Ҳм№ҳ н‘№мӢ н•ң мҶңмқҙл¶Ҳмқ„ к№”м•„лҶ“мқҖ л“Ҝ м•ҲмҳЁ(е®үз©©)н•ҳкё°к№Ңм§Җ н–ҲлӢӨ. м–ём ң лҙҗлҸ„ м§Җк·№нһҲ нҷ©нҷҖн•ҳкі нҸүмҳЁн•ң кҙ‘кІҪмқҙм—ҲлӢӨ.
“кі лӢҲмӢң мң нӮӨлӮҳк°Җлқј….”
н•Ҹл№ӣ лҸҷл…ҳмқ„ н•ҳм—јм—Ҷмқҙ л°”лқјліҙлӢӨк°Җ лӮҳлҸ„ лӘЁлҘҙкІҢ к·Җм—җ мқөмқҖ мҷңмһҘмқҳ мқҙлҰ„мқҙ нғ„мӢқмІҳлҹј нқҳлҹ¬лӮҳмҷ”лӢӨ. 비лЎқ к·ём—җ лҢҖн•ҙ м•„лҠ” л°”к°Җ м „нҳҖ м—Ҷм§Җл§Ң к°„н—җм ҒмңјлЎң л“Өл ӨмҳӨлҠ” к·ём—җ лҢҖн•ң н’Қл¬ёл§ҢмңјлЎңлҸ„ к·ёк°Җ м–јл§ҲлӮҳ лҢҖлӢЁн•ң мһҘмҲҳмқёк°ҖлҘј к°җм§Җн• мҲҳ мһҲм—ҲлӢӨ. к·ё мҷём—җлҸ„ к°ҖнҶ кё°мҡ”л§ҲмӮ¬, кө¬лЎңлӢӨ лӮҳк°Җл§ҲмӮ¬, мӢңл§ҲмҰҲ мҡ”мӢңнһҲлЎң, к°ҖнҶ мҡ”мӢңм•„нӮӨлқј, нӣ„мҝ мӢңл§Ҳ л§ҲмӮ¬л…ёлҰ¬, нһҲлқјл…ё лӮҳк°Җм•јмҠӨ, мҷҖнӮӨмһҗм№ҙ м•јмҠӨн•ҳлЈЁ, к°ҖмҠӨм•ј лӢӨмјҖл…ёлҰ¬, к°ҖнғҖкё°лҰ¬ к°Җмё лӘЁнҶ л“ұ лӘҮлӘҮ мҷңмһҘл“Өмқҳ мқҙлҰ„мқ„ м°ЁлЎҖлЎң л– мҳ¬л ёлӢӨ.
лӮҳлҠ” мҷңкөӯ мһҘмҲҳл“Өмқ„ кІ°мҪ” нҸ„нӣј(иІ¶жҜҒ)н•ҳм§Җ м•Ҡм•ҳлӢӨ. мҲҳл°ұ л…„к°„ мқҙм–ҙм ё лӮҙл ӨмҳЁ мҷңкөӯ мӮ¬л¬ҙлқјмқҙ[дҫҜ]мқҳ л¬ҙ(жӯҰ)лҠ” н•ң м№ҳмқҳ нқҗнҠёлҹ¬м§җмқҙ м—ҶлҠ” мһ”нҳ№н•ң кІҖкҙ‘(еҠҚе…ү)кіј к°ҷлӢӨ м—¬кІјлӢӨ. мЈјкө°(дё»еҗӣ)мқ„ мң„н•ҙм„ңлқјл©ҙ к·ё мһҗлҰ¬м—җм„ң лҜёл Ё м—Ҷмқҙ н• ліө(еүІи…№)лҸ„ л§ҲлӢӨм•ҠлҠ” лғүнҳ№(пӨ®й…·)н•ң мӮ¬л¬ҙлқјмқҙл“ӨмқҙлӢӨ. к·ё л№ҲнӢҲм—ҶлҠ” л¬ҙмӮ¬лҸ„(жӯҰеЈ«йҒ“)м •мӢ мқҙ л‘җл Өмӣ лӢӨ. мһ…мӢ (п§·иә«)кіј мӮ¬мҡ•мқ„ мң„н•ҙм„ңлқјл©ҙ мһҗмЎҙмӢ¬л§Ҳм Җ мҙҲк°ң(иҚүиҠҘ)мІҳлҹј лІ„лҰ¬л Өл“ңлҠ” мЎ°м„ мқҳ мһҘмҲҳл“Өкіј 비көҗк°Җ лҗ мҲҳл°–м—җ м—Ҷм—ҲлӢӨ. лҢҖк°ңмқҳ мЎ°м„ кҙҖлҰ¬л“ӨмқҖ мҷңкөӯмқ„ 섬лӮҳлқјмҳӨлһ‘мәҗлқјкі , лҳҗ н•ҙм Ғм§ҲмқҙлӮҳ мқјмӮјлҠ”лӢӨкі кіјмҶҢнҸүк°Җн•ҳм—¬ к№”лҙҗмҷ”м§Җл§Ң, к·ёл“ӨмқҖ 100л…„м—җ кұём№ң лӮҙм „мқ„ нҶөн•ҙ л¬ҙмҳҲмҷҖ лі‘лІ•мқ„ мқөнһҢ мЎұмҶҚл“ӨлЎң кІ°мҪ” л§Ңл§Ңн•ҳкІҢ ліј мғҒлҢҖк°Җ м•„лӢҢ кІғмқҙлӢӨ.
‘к·ё ліҙмһҳкІғм—ҶлӢӨлҚҳ мҷңкөӯмқҙ мЎ°м„ мқ„ мғҒлҢҖлЎң, к·ёлҰ¬кі лӮҳм•„к°Җ л°ұл§Ң лҢҖкө°мқ„ кұ°лҠҗлҰ° лӘ…мқ„ мғҒлҢҖлЎң м „мҹҒмқ„ м№ҳлЈЁкІ лӢӨл©° к·ёнҶ лЎқ м „м—ҙмқ„ к°ҖлӢӨл“¬кі мһҲлҠ” лҸҷм•Ҳ, м„ мЎ°мһ„кёҲмқҙлӮҳ мЎ°м • лҢҖмӢ л“ӨмқҖ лҢҖмІҙ л¬ҙм—Үмқ„ н–ҲлҚ”лһҖ л§җмқёк°Җ.’
мҷңкөӯмқҳ м№Ёлһөмқ„ м „нҳҖ мҡ°л Өн•ҳм§Җ м•ҠлҠ” к·ёл“Өмқ„ мғқк°Ғн• мҲҳлЎқ м–ҙмІҳкө¬лӢҲлҸ„ м—Ҷм§Җл§Ң, н•ңнҺёмңјлЎңлҠ” кё°к°Җ л§үнһҲкі м•ҲнғҖк№Ңмҡё лҝҗмқҙлӢӨ.
[ 5нҡҢ кі„мҶҚ мқҙм–ҙм§җ]
м Җмһ‘к¶Ңмһҗ danews л¬ҙлӢЁліөм ң-мһ¬л°°нҸ¬ кёҲм§Җ





















